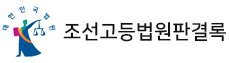조선고등법원 판결록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근대사법은 1895년 재판소구성법에 따라 한성재판소를 조직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위 법에 따라 조직된 한성재판소, 공주재판소, 경성고등재판소 등에서 근대적인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일본에게 국권을 점차적으로 침탈당하는 과정에서 1907년부터 법무보좌관제도가 실시되어 일본인 법률가들이 한국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졌고, 1907년 12월에는 재판소구성법이 개정되어 일본인 법률가들이 판사와 검사로 직접 재판에 참여하였다.
1909년 7월 일본은 사법권을 강탈하고, 그 해 10월 31일 법부와 재판소구성법을 폐지함과 동시에 (조선) 고등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제도를 구축하였다.
조선고등법원은 이렇게 1909년 11월에 설치되어 1945년 8월에 폐지될 때까지 한반도 전체를 관할하는 최고법원이었다.
과거 대법원의 판결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고등법원 판결은 선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대법원의 판례가 상당히 축적된 오늘날에도 조선고등법원 판결은 여전히 의미를 갖는다.
현재 종중 관습법상의 지상권, 분묘기지권, 민법 시행 이전의 상속관계 등 우리가 관습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당한 제도는 거의 조선고등법원 판결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고등법원 판결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현재 우리 판례, 나아가 판례에 근거하고 있는 입법의 연혁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이전의 관습법이나 분쟁 당사자 사이의 과거 법률관계를 확인하는데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후 위 법에 따라 조직된 한성재판소, 공주재판소, 경성고등재판소 등에서 근대적인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일본에게 국권을 점차적으로 침탈당하는 과정에서 1907년부터 법무보좌관제도가 실시되어 일본인 법률가들이 한국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졌고, 1907년 12월에는 재판소구성법이 개정되어 일본인 법률가들이 판사와 검사로 직접 재판에 참여하였다.
1909년 7월 일본은 사법권을 강탈하고, 그 해 10월 31일 법부와 재판소구성법을 폐지함과 동시에 (조선) 고등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제도를 구축하였다.
조선고등법원은 이렇게 1909년 11월에 설치되어 1945년 8월에 폐지될 때까지 한반도 전체를 관할하는 최고법원이었다.
과거 대법원의 판결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고등법원 판결은 선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대법원의 판례가 상당히 축적된 오늘날에도 조선고등법원 판결은 여전히 의미를 갖는다.
현재 종중 관습법상의 지상권, 분묘기지권, 민법 시행 이전의 상속관계 등 우리가 관습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당한 제도는 거의 조선고등법원 판결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고등법원 판결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현재 우리 판례, 나아가 판례에 근거하고 있는 입법의 연혁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이전의 관습법이나 분쟁 당사자 사이의 과거 법률관계를 확인하는데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다.